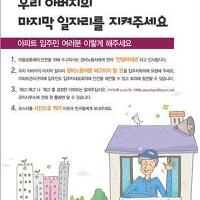기술과 예술의 사이에서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
- 사운드 엔지니어, 허정욱 녹음실장 인터뷰
정하나 선전위원
공감각적 표현이라는 걸 학창시절 국어 시간에 배운 적이 있다. “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”처럼 소리인데 색깔과 촉감까지 느껴지는,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느껴지는 언어표현을 일컫는 말이다. 그런데 실제로 종을 쳐서 소리를 내되 그 소리가 분수처럼 허공에 산산이 부서지게 하려면, 그리고 그 부서진 소리가 푸른색을 내게 하려면?
“이 소절에서 기타소리를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”
홍대 부근의 한 녹음 스튜디오(‘석기시대’)에서 만난 허정욱 씨는 실제로 기타 소리를 따듯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. 그 따듯한 기타 소리를 도자기 그릇을 깨버릴 것 같은 소리로 만들기도 하고, 부모가 어린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쳐주는 것 같이 부드러운 드럼 소리를 군인이 철문을 발로 차듯 거친 느낌으로 바꾸기도 한다. 소리를 만지고 만드는 사람, 그는 사운드 엔지니어(음향 기사, 사운드 프로듀서)이다.
“음악이 대중들의 귀에 들리기까지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작사 ․ 작곡가가 곡을 먼저 만들면 이 음악의 느낌을 잘 살려줄 악기와 소리, 리듬을 배치하는 편곡 과정을 거칩니다. 이렇게 완성된 곡의 악보대로 보컬을 포함한 각 주자들이 연주하면 녹음을 하는데, 그때부터가 제 역할이죠.”
작곡된 곡이 하나의 완성된 음악으로 되기 전, 각각의 소리를 녹음하고 그걸 한 곡으로 조화롭게 섞는 작업, 그것이 정욱 씨가 하는 일이다. 스튜디오에 찾아오는 음악가들의 음반 작업도 참여하고, 때때로 밴드들의 라이브 현장 녹음도 한다. <브로콜리너마저>, <델리스파이스>, <불나방스타소세지클럽> 등도 음반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즐겨 찾는다고 했다. 뮤지션들하고 이렇게나 많이 만난다니, 일터가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을 것 같다.
“좋아하는 밴드의 음악 작업을 같이 한다는 게 재미있죠.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건 어떤 처리도 되어 있지 않은 ‘날 것의 녹음 데이터’를 듣게 된다는 점입니다. 팬들 앞에서는 한없이 멋진 스타인데 녹음된 거 들어보니 실력은 사실 그에 못 미친다든지, 무대에서 소극적이고 자신 없어 보이던 친구들인데 ‘와 대박이다, 너무 잘한다’ 싶을 정도로 놀라게 된다든지 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. 관객은 물론이고, 제작자도 잘 모를 수 있는 원초적 상태의 실력과 소리를 컴프레서나 이퀄라이저 같은 음향장비를 사용해 장점은 더 부각하고, 부족한 부분은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.”
듣는 사람과 음악가가 직접 소통하도록
인터뷰를 진행한 공간은 수십 개의 버튼과 레버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름 모를 기계로 꽉 차 있었다.
▲ 정욱 씨가 일하는 스튜디오의 녹음실 (출처: 석기시대 스튜디오 페이스북)
“전자기기들이 많으니까 기계에서 나오는 열 덕분에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 스튜디오는 난방을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.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녹음․믹싱을 하는데요. 좋은 사운드라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거슬리는 게 없는 사운드가 아닐까요? ‘이거 소리가 왜 이렇지?’ 혹은 ‘오~ 소리 좋다’,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음악이 주려고 한 느낌과 감동 그 자체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음반을 듣는 사람과 뮤지션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”
만약 슬픈 발라드 음악을 듣는데 높은 음이 너무 뾰족하고 또렷하게 들린다면 방해가 될 것이다.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실황 녹화비디오를 보며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데, 가수의 노랫소리가 적당한 울림이나 퍼짐 없이 너무 깨끗하게 들려도 문제일 것이다.
사운드 ‘엔지니어’는 기계를 다루는 일인 만큼 여러 가지 음향기기의 성능과 사용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, ‘사운드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악과 예술을 느끼고 이해하는 감성도 그 못지않아야 할 것이다. 작곡가가 어떤 의도와 심정을 가지고 이 곡을 썼는지를 이해해야 녹음된 이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, 아니면 효과를 덧입혀 다른 감성의 소리로 바꿔줘야 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.
▲ 스튜디오에서 한창 작업 중인 정욱 씨(출처: 석기시대 스튜디오 페이스북)
“뮤지션들이 녹음하면서 ‘엔지니어님, 이 부분에서는 제 악기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게 해주세요’라고 요청은 하지만 악기 소리가 시원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인지 본인도 막연할 때가 많아요.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. 그러면 샘플을 가져와 들려달라고 합니다. 그러면 듣고 바로 알죠, 저희는. ‘어떻게 만들면 되겠구나!’ 해서 바꿔서 들려주면 그분들은 저희보고 예술가라고 합니다. 각 장르에서 명반이라 불리는 앨범들을 들으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아야 해요. 많이 들어보고 사운드가 맘에 드는 부분은 실제로 직접 만들어보면서 연습을 해 봅니다. 한 번에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,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리고 여러 장비를 실제로 다루어 보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.”
일 시작하고 초기에는 정말 돈이 없었다. 패스트푸드점에서 1,500원짜리 제일 싼 햄버거랑 맹물로 끼니를 때우던 그때에도 가끔 돈 생기면 무조건 마이크를 사거나, 새로운 이퀄라이저를 샀다. 중고로 사고팔면서 그를 스쳐 지나갔던 여러 장비, 이것저것 다뤄 본 경험과 기억이 다 실력으로 남았다.
쉴 때는 음악 못 들어요
허정욱 씨도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. 학창시절에는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를 했고, 클래식 등 다방면의 음악을 듣고 즐겼다. 그러나 듣는 것 자체가 일이 된 지금은 새로운 음반을 찾아서 듣는 것이 부담스럽다.
“막상 음악을 많이 못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. 스스로 새로운 걸 찾아서 듣는 건 어느 순간 멈췄네요. 아마 이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. 고칠 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쉬면서도 또 ‘듣기는’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. 귀도 지치고 마음이 지치니까요.”
연말이면 공연이 많다. 무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, 우리 마음에 음악이 주는 위로와 쉼을 전달하기 위해 소리를 만지고 있는 사운드 엔지니어들의 자리를 이렇게 확인한다. 이번 연말 콘서트에서는 그 자리를 확인하며 들어봐야겠다.
'월 간 「일 터」 > [A-Z 다양한 노동이야기]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[A-Z 노동이야기] 노무사가 없어도 되는 세상을 희망하는 노무사 / 2015.2 (0) | 2015.02.11 |
|---|---|
| [A-Z 노동이야기] 새해, 우리의 노동을 응원해줘 / 2015.1 (0) | 2015.01.19 |
| [A-Z 노동이야기] 원고느님의 신성함을 알렷다? / 2014.11 (0) | 2014.11.12 |
| [A-Z 노동이야기]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그의 노동은 / 2014.10 (0) | 2014.10.14 |
| [A-Z 노동이야기] 도서관 선생님을 꿈꾸는 서점 직원 / 2014.9 (0) | 2014.09.16 |